보내는 기사
[지평선] 검사와 스폰서, 그 질긴 악연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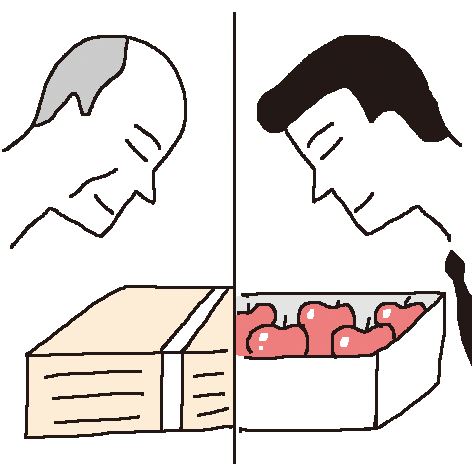
‘스폰서 검사’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 사태 때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업가인 스폰서로부터 강남 아파트 구매 대금과 고급 승용차, 해외골프, 명품쇼핑 등을 제공받은 의혹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천 후보자는 온갖 기이한 변명을 대며 위기를 모면하려 해 검사들로부터 “쪽팔려 못살겠다”는 말까지 들었다. 당시 청문회에서 나온 황당 해명 한가지. 의원들이 앞서 치른 아들 결혼식에 대해 묻자 “조그만 야외에서 조용히 치렀다”고 둘러댔다. 알고 보니 야외긴 한데 심은하, 김희선 등이 결혼한 국내 최고의 특급호텔로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 이듬해는 더 큰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졌다. 부산의 한 건설업자가 검사 수십 명에게 20년간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해 발칵 뒤집혔다. 하지만 명백한 물증에도 스폰서 검사들이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남자 그는 ‘검사와 스폰서, 묻어버린 진실’이라는 책을 냈다. “지청 검사들에게 한 달에 두 번씩 30만원~100만원씩 상납했다. 1986년부터는 전별금조로 최소 30명의 검사들에게 순금 마고자 단추를 선물로 줬다.” 그는 “모델들을 불러 ‘원정 접대’를 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고속도로순찰대 호위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 한동안 잠잠하던 스폰서 검사가 다시 얼굴을 내밀었다. 현직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수시로 향응을 받은 데 이어 수사 무마 대가로 돈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 부장검사는 “감찰 대상이 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며 스폰서 친구에게 조작, 은폐를 지시했다. 더 큰 문제는 검찰 지휘부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돈을 준 사람의 폭로가 없었으면 그냥 묻혀 버릴 뻔했다.
▦ 검찰 내부의 ‘스폰서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인척이나 동문, 고향 선후배로부터 접대를 받아도 사건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괜찮다는 뿌리 깊은 믿음을 검사들은 갖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얻어 먹는 쪽은 ‘우정’이지만 제공하는 쪽은 ‘보험’이라고 여긴다. 기업인, 정치인과 친분이 두터운 검사를 “잘 나간다”고 치켜세우는 분위기도 악습을 부추긴다. 아예 자정기능을 상실한 검찰 조직을 이대로 놔둬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충재 논설위원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