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경기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합동 기자회견에서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 등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5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행정절차 단축을 통한 2031년 첫 입주가 정부의 목표다. 그린벨트 해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이후 12년 만이다.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 등도 추진된다.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당 5,500만 원,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43대 1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건 맞는 방향이다. 그런데 굳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불안은 2026년 이후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이란 우려다. 아파트 공사 기간은 통상 3년 이상인데, 연 평균 50만 가구 안팎이던 전국 아파트 착공 물량이 지난해엔 반 토막까지 줄었다. 서울 입주 물량은 내년 3만5,000가구에서 2026년 7,000가구로 급감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은 아무리 빨라도 7년 후다. 당장 들썩이는 집값과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엔 큰 도움이 안 된다. 자칫 투기만 부추길 수도 있다. 미래 세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급적 남겨둬야 할 ‘수도권 허파’를 훼손하기엔 명분도 실익도 약하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공급계획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토부는 2020년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척은 전혀 없다. 용산 정비창과 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용지 등도 사업 축소나 중단 상태다. 2020년 이후 정부가 인허가를 내준 공공분양 단지 200여 곳 중엔 아직 착공도 못 한 곳이 더 많다. 올해 10만 가구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실적은 1% 안팎이다. 잦은 입주 지연으로 ‘희망고문’이 된 사전청약제도는 논란 끝에 폐지 수순이다.
정부는 기존에 약속한 공급 계획부터 점검하고 철저히 이행해 정책 신뢰를 회복하는 게 순서다. 보고 싶은 통계만 내세우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대응하면 전 정부의 과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할 일은 그린벨트를 허무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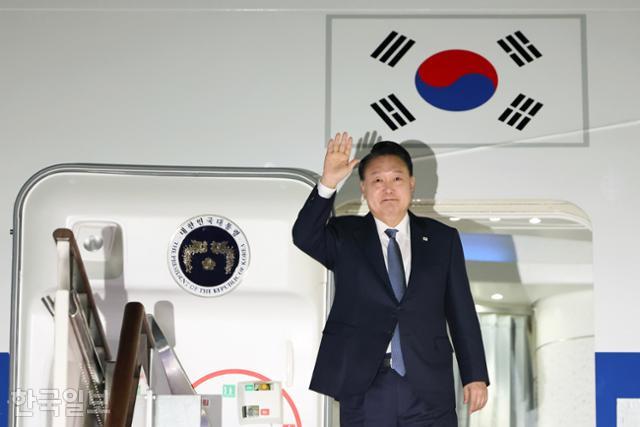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