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2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복귀 디데이가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30명 남짓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데드라인’을 넘어서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은 전공의는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진다. 의료 현장 공백이 장기화하며 불편도 커지겠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문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 등 전공의 수련을 모두 마치고 시험에 응시해야만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전문의 수련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추가 수련으로 메울 수 있는 최대 공백이 3개월이다. 지난 2월 19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1,630명, 다음 날인 20일에 이탈한 이는 6,183명이다. 그제와 어제가 복귀 시한이었지만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일 기준 병원을 지키고 있는 레지던트는 전체 9,996명 중 659명(6.6%)에 불과하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전공의에 한해 이탈기간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주겠다며 유화책을 꺼내 든 상태다. 뒤늦게 병가나 휴직 서류를 제출해도 예외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많은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지만, 집단행동을 부득이한 사유로 포장해주는 게 마냥 허용되긴 힘들 것이다.
의대 본과 4학년생 상당수는 9월로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 데드라인을 넘겼다. 의료법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시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수업 거부가 길어지면서 졸업을 위한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2020년에 국시 재응시 기회를 준 데 이어 이번에는 국시 일정 연기를 검토 중이다. 요즘은 졸업 전 취업한 이들에게조차 수업 면제가 금지되는데, 의대생만을 위한 원칙 파기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공의나 의대생에게 끝없이 예외를 인정해주긴 어렵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특권의식만 더 굳힐 수 있다. 정부가 설득 작업을 이어가야겠지만, 원칙대로 처리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 그래야 협상 여지도 더 넓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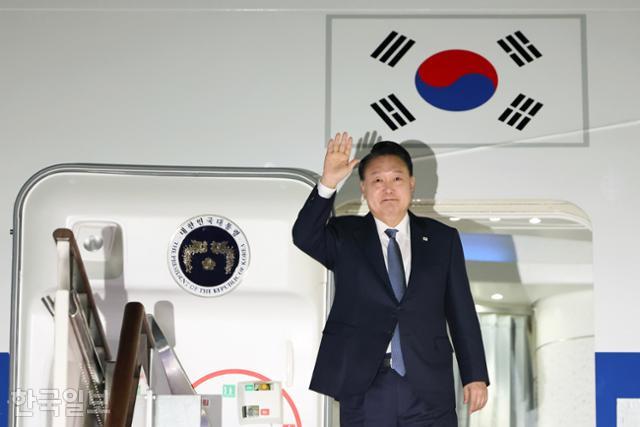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