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 의미를 ‘기업의 자유’로 축소
세계화·정보화에 소외된 계층 포용 못해
70·80년대 방식 반복에 지지층도 실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자유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기업활동의 자유와 국가의 역할'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옹호자임을 자부한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생각이 잘 정리된 최신 자료가 3월 20일 열린 ‘상공의 날 기념식’ 특별 강연이다. 강연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는 공정하게 경쟁해서 국민 후생을 극대화하고, 공정한 배분이 이뤄지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국민 모두의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의 역할은 개인들이 각자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던 자유시장 경제학의 거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들었다면 기뻐할 연설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중에는 자유시장 원칙과 상충하는 것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윤 정부는 통신·전기 요금부터 최근엔 사과와 대파 가격까지 ‘안정화’하는 데 공권력을 동원한다. 진정한 자유시장경제 옹호자라면 하이에크가 말한 “가격 시스템이 불완전한 지식을 가진 개인에게 ‘암묵적 지식’을 전달해 오류를 줄여주는 역할”을 왜곡하지 않을 것이다. 또 주식가격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바로잡아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동성도 늘려주는 시장의 자율작동 장치인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 역시 자유시장 신봉자라면 고개를 저었을 것이다.
이런 모순은 윤 정부의 본질은 보수주의이며 자유시장 원칙은 옷에 불과하기 때문이 아닐까. 보수주의가 자유시장이란 옷을 입는 것은 서구의 오랜 전통이다. 다수결 원칙으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 보수주의자는 자신들 최고 가치인 전통질서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대항 체제인 자유시장과 손을 잡아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보수주의는 자유시장이란 옷을 입기로 하면서 서구 발전의 과실을 공유했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1960년대부터 국가주도 개발독재와 손을 잡았으나, 민주화와 세계화가 본격화한 1990년대 자유시장의 옷을 입으며 한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보수주의는 자유시장이 불편해졌다. 복지 확대로 커지는 세금 부담, 정부 권한 증대와 무능 등이 주된 이유이다. 그래서 서구 보수주의는 자유무역과 이민자의 증가로 일자리를 잃은 블루칼라, 농·어민과 손잡고, ‘반세계화·이민자 추방’을 내세우는 강경 우파 세력을 구축했다. 영국 언론인 에드먼드 포셋은 신간 ‘보수주의’에서 영국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EU) 탈퇴파가 승리하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2016년을 이들 강경 우파가 정치 전면에 등장한 원년이라고 말한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탄생도 이런 서구 조류와 무관하지 않다. 86세대로 대표되는 한국 중도 좌파가 자유시장 특히 자유무역과 제휴하며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조화를 이뤘지만, 세계화 과정에서 소외된 소상공인 비정규직 농어민의 불만이 쌓여갔다.
이런 불만의 대안으로 등장한 윤 정부는 자신을 지지한 불만 계층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보다, 1980년대의 국가 주도 권위주의로 회귀를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종종 자유민주주의를 반공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그래서 윤 정부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공헌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건국 전쟁’에 몰두했다. 또 시장경제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로 재해석됐다.
이런 대응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격차 확대와 정보기술 발전 중국 부상에 위협을 느끼는 전통제조업과 자영업자에게 실망감만 안겨줬다. 낡은 보수주의로는 급변하는 경제에 소외되고, 특권층이 된 86세대의 이중성에 분노하는 계층을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 정부 여당이 목전에 다가온 총선에서 고전하고 있다면,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이 입은 자유시장이란 옷이 오늘날과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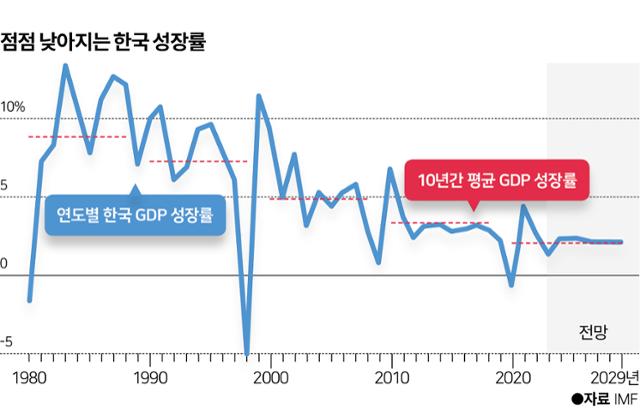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