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마스 홉스의 고전 리바이어던 삽화.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연말 이후 미국 언론의 새해 전망에서 낙관론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미국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방역 실패를 딛고 사망자와 중증 환자 비율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경제도 높은 취업률 등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미국에 맞서 온 중국이 코로나19 초기, 관리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방역 정책이 대실패로 치닫는 데다, 경제 역시 추락하는 상황을 보며 느끼는 안도감 때문일 것이다. ‘202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던 예측들은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미국과 중국 상황 반전의 원인을 “누구도 최고 지도자에게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중국의 권위주의 정부 시스템”에서 찾는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을 체제 우월성을 향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개선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요슈카 피셔 전 독일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은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칼럼에서 “중국 지도자의 실패는 권력의 기반이 국가와 국민 간 ‘사회 계약’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온갖 반대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권력자의 ‘자기 절제’가 작동해 권위주의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라고 덧붙인다.
서구의 안도감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새삼 생각하게 된다. 미국 경제학자 대런 애스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은 공저 ‘좁은 회랑’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정치체제를 ‘족쇄를 찬 리바이어던’이라고 묘사한다.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괴물 리바이어던 같은 국가를 시민사회가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체제다. 책은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이룬 상태를 ‘좁은 회랑’이라고 부르며 이 좁은 회랑에 위치해야 자유와 번영이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이곳이 좁은 이유는 균형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회랑인 이유는 균형을 잃으면 언제든 밖으로 이탈할 수 있는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1987년 직선제 개헌을 통한 민주주의 체제 수립, 노동자 권익의 대폭 신장을 가져온 ‘노동자 대투쟁’ 등을 통해 리바이어던에 족쇄를 채우며 ‘좁은 회랑’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35년이 흐르며 이른바 ‘87년 체제’의 문제점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중구조 고착화 등이 손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새해 3대 개혁 대상 맨 앞에 노동을 내세운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그런데 9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담긴 개혁 방안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비민주적 행태는 개혁해야 하지만, 이를 빌미로 노조 회계를 샅샅이 훑어보겠다는 것은 노조 자율성을 제약하는 조치다. 노조 회계는 투명해야 하지만, 노조원들에게만 공개하면 된다. 또 사업장 내 특정 직군·직종·근로시간 등의 차이를 고려해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근로자들의 분열을 초래해 노동삼권 중 하나인 단결권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노조 파업 시 대체근로 가능 업종 확대 검토 역시 단체행동권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현 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에는 국가의 강력한 견제 세력인 노동계 힘을 약화하려는 장치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정부가 “개혁과 기득권 타파”를 외칠 때마다 지지도가 높아진다. 그만큼 ‘87 체제’가 시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만큼 낡았고, 또 낡은 체제에 기생하는 기득권 세력들도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뜯어고치는 것은 시급하다. 하지만 민주적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치’를 강조하며 몰아붙이는 것은 위험하다. 혹시 리바이어던의 족쇄가 느슨해지지는 않을지, 리바이어던에 맞설 시민사회가 약화하는 건 아닌지 꼼꼼히 감시 견제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언제든 좁은 회랑 밖으로 탈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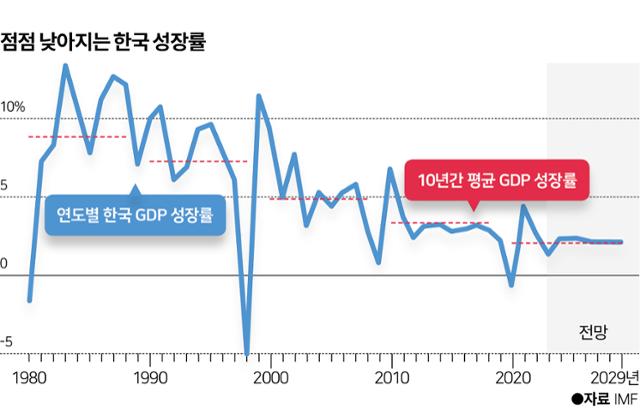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