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레버 노아
나는 웃기고 싶다. 평소 전혀 표정이 없어서 나를 포커페이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의외이겠지만 말이다. 사실 나는 표정이 없는 게 아니다. 얼굴에 너무 살이 많아서 웃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심지어 나에게 화가 났냐고 묻는 사람도 있던데 진실을 밝히자면 나는 평생 반가사유상과 모나리자 뺨치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다만 얼굴에 집중된 지방 때문에 그 미소가 본의 아니게 '내적 미소'가 되고 말았을 뿐이다. 볼살 때문에 사람들이 내 내적 미소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미학적으로 봤을 때 인류의 커다란 손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끔 내적 미소가 이가 다 드러나는 외적 미소로 변환되는 순간이 있기는 하다. 이를테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트레버 노아의 스탠드업 코미디를 볼 때 그렇다. 인종 간 결혼 자체가 불법이었던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카사족 흑인 어머니와 스위스인 백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제도를 뛰어넘어 어머니와 사랑에 빠진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스위스 사람들이 초콜릿을 워낙 좋아하잖아요.'
아슬아슬하다. 기껏해야 얼굴 볼살을 가지고 수준 낮은 유머를 구사하는 나와는 다르다. 트레버 노아는 존재 자체가 불법이었던 자신의 아픈 정체성을, 시대와 사회의 억압을, 박장대소하는 유머로 만들어 낸다. '길을 가다 경찰이 나타나면 엄마는 제 손을 놓고 이렇게 말하곤 했죠. 몰라요. 몰라요. 제 애가 아니에요.' 익살스럽게 엄마의 말투를 묘사하는 트레버 노아를 보면서 나는 유튜브 속 청중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린다. 웃다가 나는 문득 그의 슬픔을 느낀다. 그리고는 스스로 묻는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이야기에 웃는가?
흉곽을 발작적으로 수축시키면서 숨이 넘어갈 듯 소리를 내는 행위. 때로는 자신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본능적인 행위. 사람들은 왜 웃는가? 웃음의 이유에 대한 이론은 웃는 이유만큼이나 다양해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우월감 이론, 긴장된 에너지를 표출하기 위해서라는 에너지 방출 이론 등 다양하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런 이론 중에서 내가 제일 그럴싸하다고 여기는 이론은 '거짓 경보 이론'이다. 먼 옛날 인류의 조상들이 무리를 이루고 살던 시절,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포착되었을 때, 그 상황이 위험한 것이 아님을 알리는 것이다. 맹수 아니고, 그냥 내가 걷다가 미끄러져서 자빠진 거야. 이런 정보를 알리는 헐떡임은 높은 전염력을 가지고 전파되었을 것이다. 헐떡거리는 소리를 내지르며 무리의 일원들은 함께 즐거워 했을 것이다. 우리는 안전해. 안전하다고!
웃기는 것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미국의 소설가 커트 보니것(Kurt Vonnegut)은 웃음에 대해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다. 그는 아주 간단한 농담이라도 그 근원에는 두려움의 가시가 감춰져 있다고 말한다. 예컨대, 끔찍한 집단수용소에서도 사람들은 농담을 한다. 그 농담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유머의 심리를 연구한 로드 마틴(Rod A. Martin)은 유머를 지각함으로써 유발되는 다양한 강도의 감정을 '환희'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커트 보니것은 그 환희의 순간에 대해서 전한다. 2차 세계 대전 드레스덴 대폭격의 와중에 지하실에 앉아 있던 그는 한 병사에게 뜬금없는 소리를 듣는다. 머리 위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 병사는 대저택에 앉아 있는 귀부인처럼 이렇게 말한다. '이런 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웃는 이는 없었지만 보니것은 이 말이 함께 지하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아직 살아있다는 감정',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고 하고 있다. 그 감정이 환희다.
너도 안전하고 나도 안전해. 우리는 안전해. 여기에서 느껴지는 환희. 진지하게 격렬한 춤을 추다가 실수로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폭소를 터뜨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넘어진 이가 멋쩍어하며 일어날 때, 그 광경을 보는 사람도 웃고 당사자도 웃는다. 그러나 넘어진 사람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그 광경을 보고 웃는 이는 없을 것이다.
만약, 부상당한 이를 향해 웃었다면 그것은 웃음의 대상이 되는 외부 집단의 일원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웃음은 내부 집단의 결속을 만들어 내지만 외집단의 타인을 향해서는 잔인한 폭력성을 드러낸다.
농담 같지만, 세계는 특정한 유머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의 집합의 무수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방귀라는 말만 들어도 깔깔거리는 어린아이들과, 그 말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어른들. '힘'이 개입되는 구분도 있다. 다른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농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들과, 그저 농담의 대상이 되어 그 농담을 견뎌야 하는 이들의 집합들. 이런 집합들의 체계는 종종 그 모순들을 그대로 노출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수해 현장에서 피해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채널A 화면 캡쳐
한 국회의원의 농담이 그렇다. 그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농담했다. 그는 환희의 감각을 선사하는 사회적 놀이인 '유머'를 행함으로써 함께 모인 동료들의 긴장을 풀어주고자 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적 현상인 유머는 그 유머를 사용하는 사람의 위치와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그의 농담은 선명하게 말해준다. 그가 나누고자 하는 안전한 감각, 환희의 감각이 수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그의 농담은 사실 이런 감각을 보여준다. 너희는 안전하지 않지만 나는 안전해.) 처참한 수해의 현장과 이재민들의 고통은 그와는 아무 관계없는, 그저 농담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수해 현장에서 여성 국회의원을 향해 내뱉어진 남자 국회의원들의 농담들도 그랬다. 영상에서 남성 의원들의 농담이 대부분 여성 의원을 향했다는 점은 논하지 말자. 여성 의원의 흰머리를 보고 나잇값을 한다는 우스갯소리, 장화를 찾는 여성 의원을 향해 여자가 발이 크면 좀 그렇다는 놀림말은 여성이 남성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 대상'임을 보여준다. 설령 그 여성이 권력을 가진 경험 많은 국회의원이어도 말이다.
나는 웃기고 싶다. 유머는 인류의 일원인 나에게 주어진 본능이기 때문이다. 그 본능으로 인류는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그러나 어떤 유머는 다른 이들의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파괴한다. 그날 수해 복구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의 농담은 이를 증명한다.
그들의 농담은 수해 현장의 완벽한 일부, 재난 그 자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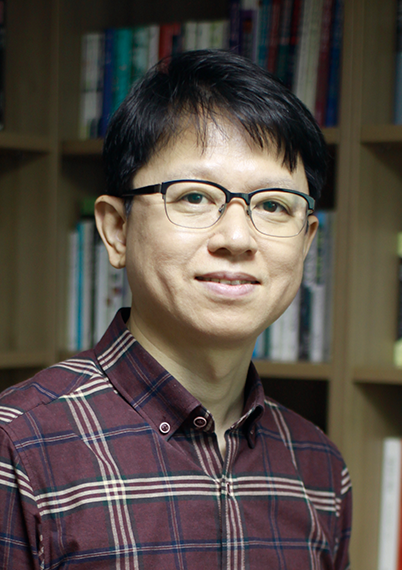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