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다시 생각나는 팔레스타인의 슬픈 눈동자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가족을 잃은 팔레스타인들. AFP 연합뉴스
가는 길부터 평탄치 않았다. 육로로 국경을 넘는다는 건 늘 묘하게 설레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국경만큼은 피하고픈 골칫거리. 여권에 이스라엘 방문기록이 남으면 입국을 거절하는 나라가 많은 데다 열린 국경도 제한적이라 자칫하면 일정이 꼬이기 십상이다.
미리 신경 쓸 것도 많았다. 그간 시리아나 레바논을 드나든 흔적이 무수하니 별도 심사는 따놓은 당상. 수상하게 볼 만한 취재수첩의 자잘한 메모도 없애고 들고 다니던 명함도 버려야 했다. 결국 마지막까지 미루고 미루다 택한 길은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들어가는 국경, 2014년 우리나라 단체관광객에게 폭탄테러가 일어났던 길이다.
역시나, 별실로 데려가 심문을 한다. 왜 그리 오래 레바논에 있었는지, 시리아에 지인은 없는지부터 시작해, 2년간의 취재일정을 처음부터 짚었다가 거꾸로 되짚었다 하며 검증이다. 딴 나라에서는 스캔으로 대충 훑고 말던 배낭도 바닥부터 다 헤집어 살핀다. 그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고 나니 어느새 국경도시의 저녁이 저물고 있었다.
일단 국경을 통과하고 나서 만나는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지나칠 정도로 평온했다. 옛 성벽에 둘러싸인 예루살렘 구시가는 오랜 발길에 반들반들해진 돌길이었다. 그 골목에 늦은 오후 햇살이 스며들 때는 어찌나 따뜻하고 평화롭던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걸었다는 자취부터 유대인지구, 무슬림지구, 크리스천지구, 아르메니안지구로 4등분해서 살아가는 성안 모습도 그대로였다.
성벽 밖 신시가지는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세련되고 활기찼다. 근사한 식당부터 음악소리가 뿜어져 나오던 클럽까지, 어느 길에서 폭탄이 터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이방인의 눈엔 잘 보이질 않았다. 이슬람교도가 많이 모이는 성문 근처 가판에는 알록달록한 젤리가 한가득, 그 달콤한 군것질을 보며 꿀꺽 침을 삼키는 아저씨들을 보며 주변 아랍국가들과 똑같다며 키득 웃음도 나왔다. 유대교 촛대, 성모상, 아랍식 카펫을 한자리에서 파는 어느 가게를 보고는 이곳만의 아름다운 공존이구나 싶었다.
이 얄팍한 관찰이 언제라도 깨질 수 있는 미약한 평화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된 건, 베들레헴이 있는 서안지구로 가는 길이었다. 지도 한 장으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될 만큼 복잡한 경계와 정치관계가 얽혀 있는 곳. 유대인 정착촌에서 저임금 노동자로 일하며 매일 그 유명한 ‘분리장벽’을 통과해야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작은 검문소를 가득 채우고 있던 수백 개의 눈동자가 내내 잊히질 않는다. 체념한 듯한 눈동자 저 밑에서 자글자글 끓는 분노를 느꼈다면 단지 상상이었을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너무나도 자유로웠던 텔아비브, 한없이 온화했던 갈릴리호수 이야기를 도무지 할 수 없는 슬픈 나날이었다. 잔혹한 폭격이 쏟아지고 부모의 품에서 아이가 죽어가는데 여행의 추억 따위가 무슨 소용이랴. 이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중심이 된 알아크사 사원 바로 아래에는 검은 옷을 입은 유대인들이 소원쪽지를 끼우며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 있다. 그 벽 위로 반짝이는 바위사원에서는 무슬림들이 그곳에서 승천했다는 무함마드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 하지만 ‘같이’ ‘산다’ 이 두 단어를 동시에 쓰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양대 종교가 그리 오래 쌓아온 기도로도 힘든 일인가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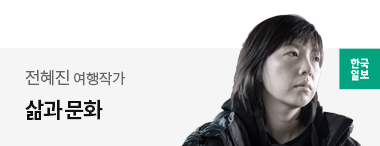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