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인문학과 크로스오버로 과학의 문턱을 넘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을 읽다
정인경 지음
여문책 발행ㆍ376쪽ㆍ1만7,8000원
페이스북에서 시작한 과학책 읽기 모임이 벌써 3년째다. 매달 한 권의 필수도서를 정하고 같은 주제의, 난이도가 다른 몇 권의 책을 보조적인 읽을거리로 함께 추천한다. 온라인의 특성에 맞게 수천 명을 대상으로 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느슨하고 유연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큰 장점이지만, 한계도 많다. 직접 만나 서로가 이해한 방식을 점검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은 서로 가르쳐주며, 다른 생각들이 서로 부딪쳐 앎을 강화하는 과정이 온라인 그룹의 특성상 생략되는 것이다.
과학책을 읽는 그룹은 다른 책읽기 그룹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다. 아니 희소하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유가 뭘까? 길잡이가 되어 줄 사람도, 가이드북도 많지 않기 때문일 터다. 과학사와 과학기술학을 전공한 정인경 박사의 새 책 ‘과학을 읽다’는 과학의 문턱도 낮추고 과학이 인문학적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길잡이로 삼기에 적합한 책이다. 과학과 인문학의 크로스오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이 책은 꽤 시의적절하다.
책은 역사, 철학, 우주, 인간, 마음이라는 다섯 개의 주제를 다룬다. 저자는 하나의 주제마다 각각 5권의 책을 제시한 후 이 책들의 내용을 매개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해 나간다. 결국 총 25권에 이르는 ‘책에 대한 책’인 셈이다. 핵심은 어디까지나 과학이지만 ‘과학으로 인문학 하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역사, 종교, 철학, 사회, 윤리 등 인문적 주제들이 심도 깊게 다뤄진다.
이를 테면 저자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나 ‘사랑의 단상’,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의 ‘교수형’ 같은 에세이, 영국의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의 ‘축의 시대’와 같은 종교학 저술, 이탈로 칼비노의 ‘우주 만화’ 같은 환상소설 등 일반적인 과학 전공자로서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인문서들을 각각의 주제를 풀어나가는 길잡이로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나 ‘문명의 붕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등의 내용을 곳곳에 배치해 역사를 문명 차원에서 벗어나 우주의 탄생과 기원에서부터 바라보는 ‘빅 히스토리’ 관점까지 제공하고 있다.
역사적, 거시적 시각은 자칫 수박 겉핥기로 흐를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저자의 철학적 문제 의식이 단단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니체, 비트겐슈타인 등과 같은 철학자를 통해 그들의 고민이 당대 과학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고찰한다. 특히 뉴턴의 과학이 칸트 철학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으며 어떤 한계를 갖는지, 비트겐슈타인의 문제의식은 무엇이었으며 그가 도출한 실재와 가치의 관계, 나아가서 과학에 있어서의 가치 판단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한다. 인간의 삶의 문제와 실천 윤리를 다루는 뇌과학자의 생각까지 두루 섭렵한 뒤 저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과학은 도구이기 이전에 실재하는 세계를 설명하는 ‘앎’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가치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사실과 가치는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과학과 기술을 알고 이용함에 있어서 어떤 도덕적 책임도 피할 길은 없다.”
과학책 읽는 보통사람들 운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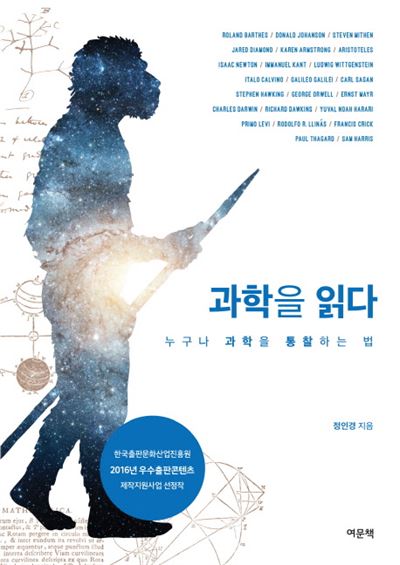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