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서로 넘나드는 소설과 영화 ‘예술家 이란성 쌍둥이’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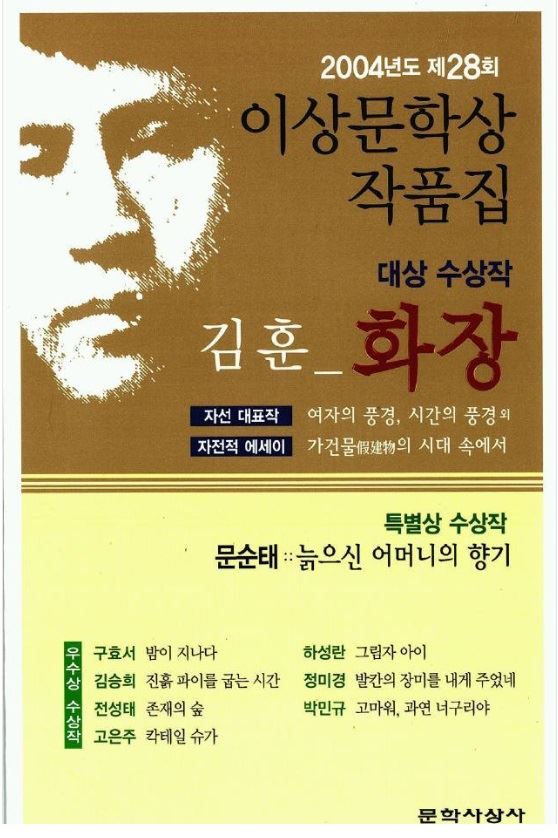
소설 속 영화, 영화 속 소설
이대현 지음
다ᄒᆞᆯ미디어 발행ㆍ260쪽ㆍ1만5,000원
당신이 소설책을 읽다가 다음과 같은 세 문장을 만났다. 다음 중 가장 고급한 문장은? ①원장 선생님은 자동차를 타고 갔다 ②원장 선생님은 소형차를 타고 갔다 ③원장 선생님은 티볼리를 타고 갔다. 정답은 당연히 ③번 ‘티볼리를 타고 갔다’. 원장의 취향과 계급, 경제력과 사회상은 자동차보다 소형차에서, 그보다는 티볼리에서 훨씬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시대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현대소설에서 ‘좋은 문장’은 이렇게 아포리즘이나 미문이 많은 문장이 아니라 단어의 수준이 좋은 문장이다.
물론 명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발표 당시보다 21세기 더 많이 읽히는 허먼 멜빌의 단편 ‘필경사 바틀비’는 20세기 미국 자본주의 사회를 뉴욕 월가의 월급쟁이 바틀비의 삶으로 드러낸다. 고용주 변호사의 명령에 바틀비가 겨우 내뱉는 한 마디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I prefer not to~).” 끊임없이 운동해야만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바틀비의 적극적 수동성이 이 한 마디에 압축돼있다(의지를 나타내는 ‘I will~’, ‘I will not~’ 이 결코 아니다).
소설 속 화자, 말하는 이는 단어의 범위를 정한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서술 가능한 ‘탕탕탕’ 울리는 총소리는 1인칭의 세계로 넘어오며 존재할 수 없는 단어가 된다. 올해는 수상에 실패했지만 매년 노벨문학상 단골 후보로 꼽히는 살만 루슈디의 대표작 ‘한밤의 아이들’, 필립 로스의 ‘네메시스’ 등에서, 남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전하는 ‘3인칭적 1인칭’까지 등장한다.
영화에서 저 티볼리는 원장과 교사의 대화로, 원장이 손에 쥔 자동차 열쇠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풀 샷(full shot)으로 묘사될 터다. 그 방식은 카메라 워크, 즉 렌즈의 위치와 렌즈가 담아낸 장면과 장면의 틈(shot by shot)으로 드러난다. 영화평론가가 제작 기술 방식, 화면 비율에 목을 메는 이유다.
물론 이 두 예술은 ‘이야기’를 ‘본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많은 소설이 영화로, 어떤 영화는 소설로 재탄생하는 이유다. 이대현 국민대 겸임교수가 쓴 ‘소설 속 영화, 영화 속 소설’은 ‘허삼관(매혈기)’ ‘케빈에 대하여’ ‘화차’ 등 같은 줄기에서 뻗어나온 소설과 영화 24쌍을 비교해 소개한다.
틈틈이 자기 자신의 생활도 녹여낸다. 예컨대 김훈의 소설이자 이를 영화로 풀어낸 임권택의 ‘화장’을 다루며 필자 자신이 기자시절 김훈에게 “3년 가까이” 문학을 읽는 법과 기사 쓰는 법을 배웠노라 소개한다. 필자가 김훈의 소설에서 멜빌의 ‘I prefer not to~’에 버금가는 표현으로 꼽는 말은 ‘알 수 없다’이다. ‘화장’의 주인공처럼 중년인 필자 자신의 아내도 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했으며 그로 인해 자신과 아내가 결코 나눌 수 없는 고통을 서로 겪고 있다는 고백도 덧붙인다. 살아갈 자(남편)과 죽어가는 자(아내)의 고통의 간극이 이 ‘알 수 없다’는 한 마디에 담겨 있다. 소설이 잔인할 만큼 날카롭고 솔직하게 인간의 고통과 소통 불가능에 대해 말한다면 영화는 남편의 불안, 고통, 공포, 절망, 고민, 포기, 슬픔을 과장하지 않고 일상처럼 드러낸다.
책은 소설과 영화의 장르적 차이보다 공통점 찾기에 비중을 더 할애해 작품 줄거리 소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해당 작품을 보지 않은 독자에게는 친절한 가이드가 된다. 언어 예술과 이미지 예술, 두 장르의 간극을 소개한 책은 다시 묻는다. 이 모든 장르를 보고 전하는 리뷰와 비평은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원작의 진가를 메기면서 스스로 완결된 작품성을 지닐 수 있는가.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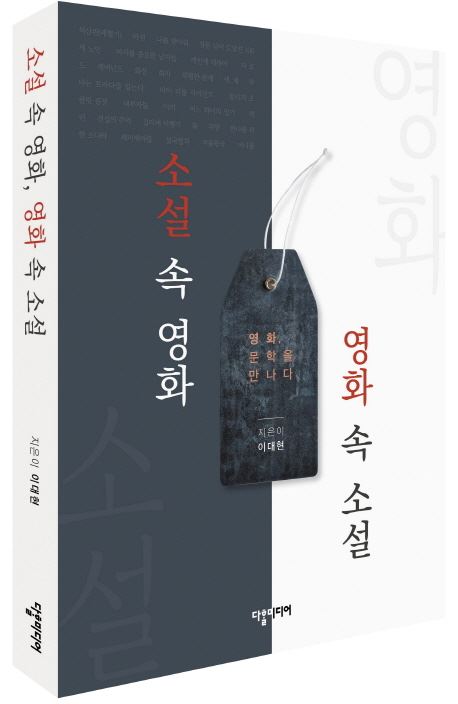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