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대통령ㆍ민주주의ㆍ철학...이게 다 일본어에서 온 말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ㆍ집필 20년...3634단어 찾아 등장 문헌부터 日 어원까지 밝혀내
"새로운 정보ㆍ어휘 쏟아지는 시대, 우리 언어에 맞게 번역ㆍ재창조해야"

대통령, 검사, 국민의례, 민주주의, 간첩, 출판, 파출소, 과학, 철학, 문학, 미술… 이 말들은 일본어에서 왔다. 일본이 서양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영어를 번역했거나, 원래 있던 한자어의 뜻을 바꿔 새로 만들었거나, 일본어의 한자어를 우리말로 읽은 것이다. 예컨대 ‘민주주의’에서 ‘민주’는 조선왕조실록에도 50회 이상 나오지만 요즘의 뜻이 아니라 민(백성)의 주인,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한국인이 늘상 쓰는 말에는 일본어가 수두룩하다. 노가다(막노동), 다마(구슬), 이빠이(가득)처럼 척 봐도 일본어임을 알 수 있는 어휘와 달리 일본어에서 온 줄도 모르고 쓰는 말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그리 된 사정이 있다. 개화기 이후 근대적 개혁 과정에서 일본 제도를 많이 참고한 데다 일본 유학생들이 돌아와 활동하면서 말이 건너왔다. 이런 현상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더 널리 퍼졌고, 해방 후에도 끊임없이 일본어 어휘가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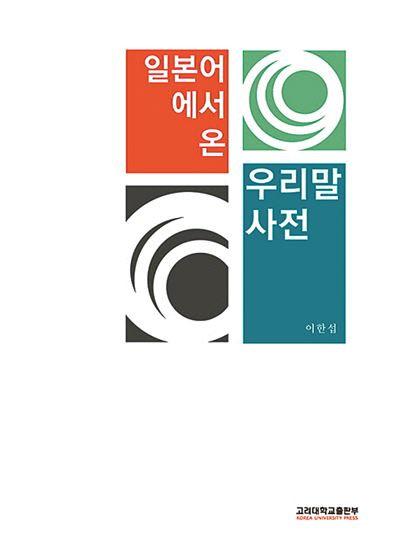
이한섭 고려대 일어일문학과 명예교수가 최근 펴낸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고려대출판부 발행)은 개화기 이후 우리말에 들어온 일본어 어휘를 조사해 정리한 책이다. 본격적인 준비와 집필에 20년 이상 매달려 완성한, 필생의 역작이다. 총 3,634 단어를 수록하고 각각 의미와 용례, 어원을 밝혔더니 983쪽의 두툼한 분량이 되었다. 표제어마다 그 어휘가 한국어에 등장한 문헌의 구절을 소개하고, 일본어에서 언제 어떻게 쓰이다가 이 땅에 들어왔는지 밝혔다.
그는 근대일본어 어휘사를 전공했다. 공부하다 보니 근대 일본어에 외국에서 들어온 말, 새로 만든 말이 많고 그것들이 청일전쟁 후 중국으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음을 알게 됐다. 개화기 이후 우리말에 들어온 외래 어휘를 파악할 필요를 느낀 것은 1970년대 대학원에 다니던 때부터다. “우리말 어휘사 연구나 현대 한국어 어휘의 성립 문제를 밝히려면 외래 어휘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연구에 몰두한 끝에 사전을 편찬했다.
일본어에서 온 말인지 알고 쓰는 게 왜 중요한가. 이 교수는 “개화기 이후 한국어는 신문물과 외래어 유입으로 격변을 겪었다”고 설명하면서 “어떤 말이 새로 생겨났고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우리말의 의미와 사용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번 사전에 수록된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만 해도 3,634 단어다. 이 많은 말들을 쓰지 말아야 할까. 새로운 말로 바꾸자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할 터이다. 이 교수는 “일본어에서 왔더라도 우리말에 녹아든 것은 인정하되,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본 제국주의 용어나 법률용어처럼 국민 권익에 직결되는 어휘는 바꾸자”고 말한다. 일례로 ‘국민의례’는 일본 기독교단이 정한 일본 왕궁 요배,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 제창, 신사 참배 등의 의식을 가리킨다. 멸사봉공, 만세삼창, 등화관제, 최후통첩도 일제의 잔재다.
사전 편찬은 개인이 혼자 하기엔 벅찬 작업이다. 일본에서 들어온 말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교수는 단어마다 일일이 자료를 뒤져 추적했다. 개화기의 소설, 신문과 잡지 100여 종을 샅샅이 살폈다. 한국어에 원래 있던 말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국사편찬위원회의 고문헌 원문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하고 ‘17세기 국어사전’을 참고했다. 중국, 일본, 대만 자료도 봐야 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1991년 한중일 소장학자를 중심으로 ‘한자문화권 근대어연구회’를 결성해 각국 문헌을 조사하고 연구해 왔다.
어떤 단어가 한국에서 언제부터 쓰였는지 효과적으로 조사하려면 국어 자료 코퍼스(말뭉치)가 필요했다. 코퍼스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게 입력한 모든 자료와 텍스트를 가리킨다. 한국어 코퍼스를 구축하는 국가 사업은 1998년 ‘21세기 세종계획’으로 시작됐다. 이 교수는 2001년부터 여기에 참여했다. 21세기 세종계획이 2008년 완성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2011년 1단계 ‘한국근대어 코퍼스’가 완성됐다. 1880년대부터 1945년까지 신문ㆍ잡지ㆍ소설ㆍ교과서 등 850여 종의 자료를 입력한 이 말뭉치는 단어마다 연도별 용례를 검색할 수 있다. 고신문은 지면 보기용 PDF 파일로 만든 후 검색이 가능한 텍스트파일로 변환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 교수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피를 말리는 작업이었다”고 말한다. 이 모든 작업이 사전을 편찬하기 위해서였다.
필생의 역작을 내놓으면서 그가 바라는 게 있다. 국가 기관으로 번역원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은 정보가 폭주하고 신기술, 새로운 사상, 새로운 어휘가 쏟아지는 시대다. 새로운 말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말 어감과 조어법, 언어 습관에 맞게 번역해서 재창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번역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외래 문명을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작업이다. 개인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다.”
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 전부터 중국 한자어나 서양 외래어가 들어오면 자기네 말로 바꿔 썼다. 반면 한국은 근현대사의 격변을 겪는 바람에 그럴 여유가 없었다. 일본에서 만든 말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개호보험 같은 어휘를 꼽을 수 있다. 국어 순화를 한다며 일본어에서 온 어휘를 중국어 어휘로 대체하기도 한다. 예컨대 ‘삐라’를 바꾼 말 ‘전단’은 1920년대 쑨원의 중국 혁명 세력이 군벌들을 상대로 뿌린 선전물을 가리킨다. 우리말을 우리말답게 가꾸려는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오미환 선임기자 mhoh@hk.co.kr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