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탈민족주의는 틀렸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999년 임지현 한양대 교수의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이후 불어 닥친 탈민족주의 바람으로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는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탈민족주의는 민족 개념이 근대 들어 급조, 심지어는 날조됐다고 본다. 이 주장에 따르면 민족을 기준으로 과거 역사를 해석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던 잣대를 들이미는 짓이다. 그리고 현재의 정치ㆍ사회현상에 민족 개념을 적용하는 건 국가의 동원ㆍ억압 기제에 놀아나거나 짐승 같은 집단 열정에 도취된 허튼 짓이 된다. 민족주의 따윈 내다버려라, 세계시민으로 거듭나라, 그게 쿨하고 멋진 선택이 됐다.
앤서니 스미스의 ‘족류: 상징주의와 민족주의’(아카넷 펴냄)는 이 지점을 돌파하려는 작업이다. 올해 83세인 스미스는 1980년대 유럽에서 민족주의 연구를 주도한 어니스트 갤너의 수제자로 영국 런던정경대 민족주의연구센터장을 지낸 사회학자다.

스미스는 민족이라는 범주가 ‘발명’(에릭 홉스봄)됐다거나 ‘상상’(베네딕트 앤더슨)된 게 아니라 실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오랜 기간 비슷한 장소에서 서로 부대끼며 살다 보니 상당한 소속감과 결속력을 지닌 인간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근대 이전엔 민족주의가 없었다는 탈민족주의의 주장은 일단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
더 큰 문제는 민족주의에 대한 부정이 또 다른 해악을 낳았다는 점이다. 바로 정치적 열정의 제거다. 스미스는 이렇게 썼다. “민족, 민족정체성, 민족주의 같은 용어들에 의해 제기된 지속적이고 심각한 개념적 혼란을 감안할 때 민족을 순전히 국가와 국가엘리트들에 의해 창조되고 조작된 ‘담론구성체’로 간주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열정’의 문제를 기피하는 결과를 낳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민족에 대해 느끼는 강한 헌신과 열렬한 애착심을 기피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탈민족주의는 명료한 이론을 위해 복잡한 현실을 내다버린 잘못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이론의 명료성 때문에 현실적인 힘도 잃어버렸다는 비판이다.
이는 “오늘날 정치적 열정은 왜 극단주의자의 몫이 되었는가”라는 슬라보예 지젝의 절규와 맞닿아있다. 민족주의를 내버리고 소속감, 연대의식이 제거된 뒤 모래알 같은 존재가 된 개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가. SNS에 우르르 몰려다니며 냉소만 일삼는다. 나는 나니까, 그게 쿨하고 멋지니까. 그러는 동안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열정은 애국, 애족을 내건 ‘어버이’와 ‘엄마’와 ‘학부모’ 단체의 몫이 돼버렸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위세를 떨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스미스는 ‘민족’이란 표현이 단일한 실체를 전제하는 것 같아 싫다면, 문화적 상징을 공유한다는 의미로 ‘에스닉’(Ethnic)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민족주의란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에스닉이란 실체적 토대 위에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얘기다. 에스닉을 ‘족류(族類)’라고 번역한 김인국 숭실대 사학과 교수를 인터뷰했다.
-‘족류’라는 표현이 어렵다.
“마땅한 번역어가 없다. 일정 장소에서 오랜 기간 서로 부대껴 살아오면서 어떤 연대감을 가진 문화공동체라는 의미다. 그간 ‘종족’ ‘부족’ 같은 말을 썼으나 이건 혈연 개념이 강해 적절하지 않다. 그러던 중 박찬승 한양대 교수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와 일본, 여진 등을 구분하면서 각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란 의미로 ‘족류’라는 단어를 널리 썼고, 이 단어가 나중에 ‘동포’로, 다시 ‘민족’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주장은 국사학계 내 소수의견으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세계적 학자가 박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도 볼 수 있다. 민족주의 연구니까 우리 단어를 택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족류가 부각된 배경은 뭔가.
“1ㆍ2차대전의 원흉이 민족주의였다. 이후 냉전 때 미국과 소련은 이념블록에다 묶어두기 위해 민족주의를 억압했다. 그런데 냉전 이후 민족주의가 분출했다. 수십 년 간 숨어있다 나타난 어떤 강렬한 공통감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는 고민이 시작됐다. 그게 바로 민족이요, 민족을 뒷받침하는 게 족류라는 얘기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전세계 75억 인구를 어떤 집단으로 나누다 보면 다소 경계가 불분명하고, 정치적으로 불만족스럽다 해도 그 어디쯤엔가 민족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결국 민족주의의 부활 아닌가.
“스미스는 계급, 지역 등 다양한 차원의 갈등을 오히려 민족이라는 범주가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쪽이다. 소속감, 연대의식 때문에라도 서로 절충하고 양보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도 개발독재 경험 때문에 민족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강한데, 그것은 그것대로 비판하더라도 내가 어딘가에 소속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에 뭔가 도움 되고 싶다는 열망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건 목욕물 버리다 아기까지 함께 버리는 모양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구분했으면 좋겠다. 전쟁 일으키고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은 국가주의적인 성향이지 민족주의가 아니다.”
-한일 갈등은 민족주의 때문이라는 시각이 강한데.
“그래서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내셔널리즘을 민족주의라 번역하지만 일본 학자들은 내셔널리즘을 아예 국가주의라 부른다. 양심적 일본 지식인들은 국가주의 대신 국민주의를 하자고 주장한다. 양국의 국가주의가 아니라 우리의 민족주의와 일본의 국민주의가 서로 만나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유별나다고 하는데 경계해야 하지 않나.
“맞다.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독특하고 예외적인 경험이다. 오랜 중앙집권의 경험이 있고, 그럼에도 식민지배를 받았다. 식민지배도 유럽이 아닌,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에게 받았다. 족류를 기반으로 한 민족주의 연구에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다. 지금 당장 어떻다고 말하기보다는 스미스의 책을 번역하면서 연구방법론을 소개했으니 앞으로는 독일, 아일랜드 같은 유럽 사례를 연구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우리와 비교하면 흥미로울 듯 하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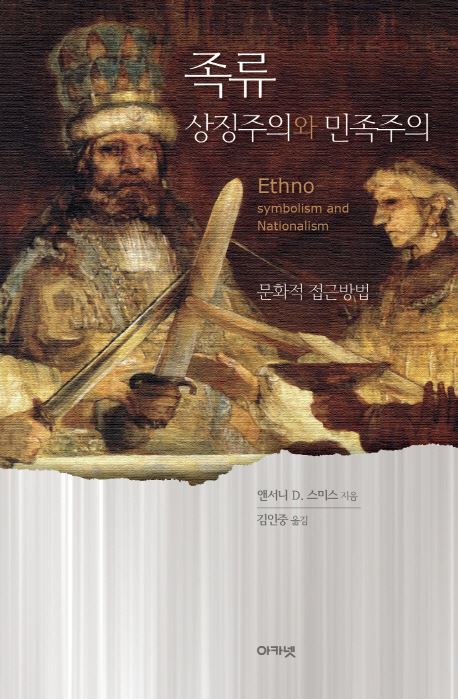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