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사냥감 위장 속의 먹이, 음식 혁명 ‘조리’에 눈 뜨게 하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 얘기는, 얘기마저도 맛있다. 먹방이 유행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요란한 음식 콘텐츠가 끊이지 않는다. 정체성과 취향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잘 먹는 것인가를 두고, 때론 비싼 밥 먹고 왜 저렇게 싸우나 싶을 정도로 거칠게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이런 자랑과 논쟁은 영양가 면에서는 대개 별다른 게 없지만, 음식 얘기의 맛을 돋우는 양념은 된다. ‘배둘레햄’ 시대에 가장 잘 먹는 방법은 사실, 조금이라도 덜 먹는 것인데도 그런다. 먹고 산다는 문제는 늘 그렇게 관심의 초점이다.
음식 관련 책도 매한가지다. 차, 커피, 술 등 기호식품에 대한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쌀과 밀 같은 주식이나 평양냉면, 돈가스, 부대찌개, 짬뽕 등 평소 즐겨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들은 넘친다. ‘알고 먹으면 괜히 골치만 더 아프다’가 아니라 ‘알고 먹어야 더 맛있다’는 주장을 담은 책 리스트는 끝이 없다.
그래서 음식 역사에 대한 종합적 서술은 더 어려워졌다. 세세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접근할 수 있는 사료들은 놀랄 만큼 많지만 가공하기가 힘들”어져서다. ‘음식의 세계사 여덟 번의 혁명’은 거기에 도전하는 책이다. 음식에 대한 온갖 얘기들을 제목 그대로 ‘조리’ ‘의례화’ ‘사육’ ‘농업’ ‘계층화’ ‘무역’ ‘생태교환’ ‘산업화’ 8가지 혁명이라는 키워드로 분류해 정리했다. 이 순서는 대략적으로는 시간 순서를 따랐지만, 반드시 그렇진 않다. 음식 얘기는 워낙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키워드에 맞춰 다양하게 조망해보는 쪽에 가깝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주는, 영양가 넘치는 최신 이론, 반론, 논쟁을 뼈대로 삼되, 펜을 쥔 손은 글맛을 살리는 재치가 있다.
가령 조리를 보자. 조리라면 다들 불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아마도 인류 역사의 첫 조리는, 지금으로서야 메스꺼운 이야기겠지만 사냥을 성공시킨 공로자에게 준, 사냥감 위장 속 소화 중이던 먹이였을 것이다. 부드러워서 먹기 편해서다. 동물이 자신의 위액으로 반쯤 소화시켜둔 것도 조리라면 조리다. 이외에도 달궈진 돌판, 자연 발화된 산불 지대 등도 조리의 후보자였을 것이다. 이쯤 되면 조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조리란 꽤 철학적 문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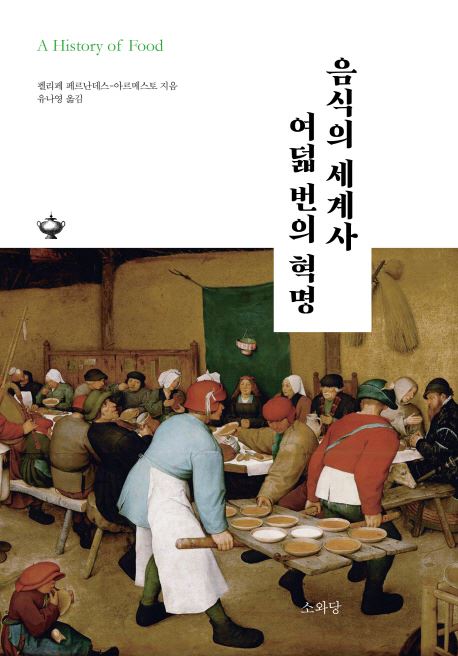
음식의 세계사 여덟 번의 혁명
펠리페 페르난데스-아르메스토 지음ㆍ유나영 옮김
소와당 발행ㆍ500쪽ㆍ2만8,000원
물론 조리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불이었다. 단순히 익혀먹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냥감을 해체한 뒤 각자 자기 몫의 고기를 지고 가서 따로 먹는 것과 모닥불을 피워놓고 빙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먹는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서다. 이런 조리는 “음식을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변형”시킨다. 그래서 저자는 패스트푸드, 냉동식품, 전자레인지 등이 부추기는 ‘혼밥 문화’, 고급레스토랑의 샐러드바 같은 ‘건강식 강박’을 우리의 진화를 거꾸로 되돌리는 행동이라 비판한다. 기쁨과 책임을 공유하는 공동체란, 불을 써서 음식을 익혀먹는 데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구석기 시대 수렵 문화도 그렇다. 오늘날 전지구적 환경오염에 넌덜머리가 난 이들은 과거를 낭만화한다. 자연과 공생하지 않으려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이들의 수렵 문화를 딱 제 먹을 것만 취하고 그친 이상적인 행동으로 그려낸다. 저자는 정반대 증거자료를 제시한다. 프랑스나 체코의 유적지를 보면 한 곳에서 말 1만 마리의 뼈가, 매머드 100마리의 유골이 발견된다. 거대한 공동주방이었을까, 혹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곳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이 유골을 보면 사람들이 먹은 흔적이 발견되는 건 일부다. 사냥하기 어려운 거대 동물은 잡을 수 있을 때 왕창 잡아야 한다. 일부는 먹고 나머지는 그냥 썩힐 수 밖에 없다. 수렵은 필요 없이 많이 죽이는 학살이다. 그게 더 진실에 가깝다.
‘녹색혁명’ 혹은 ‘신석기 혁명’이라 불리는 농업의 발생도 매한가지다. 수렵 채집하던 자유인이 왜 고단하게 일해야 하는 정주농업을 택했을까. 저자는 사냥할 거리가 적어지자 그리 됐다는 단순한 주장에서부터 오아시스 가설, 여가 활동설, 맥주 발생설 등 수없이 많은 이론과 반론을 소개한다. 저자는 오히려 역사를 들여다보면 비합리적이거나 불리한 일을 억지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농업의 경우 일단 시작돼서 인구가 불어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생산방식이었음을 지적한다.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인간이 최초로 사육한 동물은 달팽이였다는 주장, 오늘날 유럽 요리는 이슬람에서 기원했다는 설, 아보카도라는 이름의 유래, 초콜릿과 통조림의 발전, 감자ㆍ토마토ㆍ바나나ㆍ고구마ㆍ사탕수수 등 다양한 작물들의 전파 등 풍성한 이야기가 읽는 맛을 더해준다. 대중적 눈높이에 맞춰 글로벌한 음식사를 쓰겠다는 저자의 목표는 꽤 성공적이다.
조태성 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