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없으면 지속적 번영 불가능”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밝힌 역사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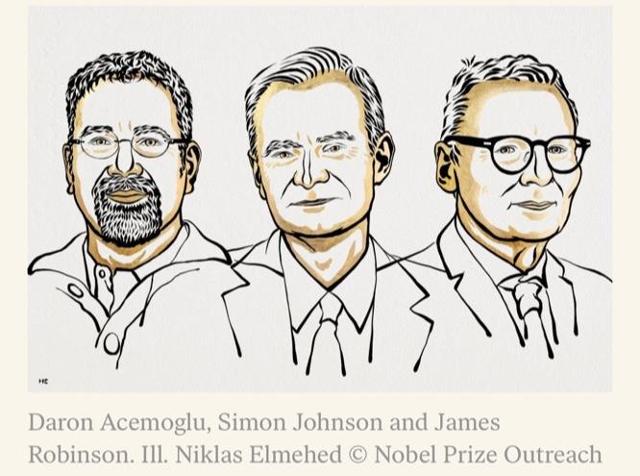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후 국내 몇몇 언론은 “한국은 국가 성공의 모범 사례”라는 수상자 멘트를 돋보이게 보도했다. 수상자들이 과거 정부 주도 경제 발전이 한국 번영의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들의 저작을 따라가보면, 오히려 시민사회가 정부를 얼마나 적절하게 통제하고 둘 사이 균형을 이루느냐가 번영의 중요 열쇠라고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리 시대 중요한 과제이며, 수상자들은 이를 위해서 사회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아제모을루는 수상자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국가 간 경제력 비교 연구는 교육수준, 효율성, 장비 투자 등을 주요 변수로 여겼지만, 그 밑바탕의 제도적 요인이 결정적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첫 번째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번영은 엔지니어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빈국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는 정치인과 관료가 경제 발전 요소를 제대로 투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사회 제도적으로 경제 참여자에게 제대로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지속적 번영의 핵심은 그 국가가 얼마나 ‘포용적(inclusive) 체제’를 갖췄느냐이다.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계층이 폭넓을수록 경제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성장을 촉진할 혁신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포용적 체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저서 ‘좁은 회랑’의 주제다. 저자들은 국가를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괴물 리바이어던으로 묘사하고 이런 괴물을 시민사회가 견제하며 균형을 이뤄야만 포용적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가와 사회가 균형을 이룬 상태가 ‘좁은 회랑’이다. 이곳이 좁은 이유는 균형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회랑인 이유는 균형을 잃으면 언제든 밖으로 이탈할 수 있는 과정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아제모을루는 지난 6월 쓴 칼럼에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포용적 체제)가 위협받고 있으며 권위주의의 도전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신자유주의와 무리한 세계화로 1980년대 이후 중·하위 계층 소득이 장기간 정체됐으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며 위기에 빠졌다. 점점 많은 유권자들이 기존 정치인보다 새로 등장한 극우 권위주의 정치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
우리나라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좁은 회랑’에 진입하며 ‘중진국 함정’을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30여 년 유지되던 포용적 체제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고등교육재단 50주년 기념식 강연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사회는 ‘승자독식 균열사회’로 변했다고 진단했다. 정치 체제는 단순 다수결 선거제로 인해 어떤 세력도 책임을 질 충분한 권한을 갖지 못하는 ‘비토크라시’로 변질해 국가의 장기적 거버넌스가 실종됐다. 또 사회·경제는 세계 수준의 대기업과 한계 중소기업, 과잉보호 받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과도한 자영업자가 공존하는 ‘격차 사회’, 초저출산·분노·고립이 넘치는 ‘갈등 사회’가 됐다. 우리 사회도 언제든 서구처럼 권위주의가 세를 넓힐 수 있는 환경이다.
아제모을루는 그럼에도 “민주주의가 여전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확신한다. 지난 600여 년간 전 세계 나라들의 부침을 연구한 결론이 확신의 근거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민주주의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더 평등주의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물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