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셰보르스키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1980년대 민주화에 헌신했던 이들이 꿈꿨던 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같은 대한민국은 아니었을 것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어기며 국민을 배신하기 일쑤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극심해졌으며 선거 때가 아니면 민의를 분출하기도 어렵다.
“이럴려고 그랬냐”는 한탄은, 다만 86세대만의 넋두리는 아니다. ‘자유·평등·박애’의 이상을 내세운 프랑스대혁명 이래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그런 기대를 어긋나는 실망이 되풀이돼왔다. 민주주의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은 세계사적 골칫거리다. 현대 민주주의는 그래서 인민의 직접 참여를 원하는 좌파나 강력한 리더십을 선호하는 우파 모두에 동네북 신세다.
이렇듯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아예 절망한 이들에게 내놓은 가장 위트 있는 대답은 윈스턴 처칠이 1947년 영국 의회에서 한 연설이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부 형태다. 지금까지 실천된 다른 모든 형태를 제외한다면.” 민주주의가 많은 사람의 기대에는 어긋나지만, 그렇다고 이것보다 더 나은 체제도 없다는 양가감정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명언이다.
이에 대한 보다 분석적이고 이론적인 설명을 원한다면, 최근 번역돼 나온 '민주주의,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이 교과서적 응답이다. 저자는 '민주주의는 오늘의 야당이 내일의 여당이 될 수 있는 체제'라는 테제로 널리 알려진 애덤 셰보르스키 미국 뉴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민주주의를 자치, 자유, 평등 등 숭고한 이상의 실현으로 보는 시각과는 선을 긋는 최소주의적 관점의 대표적 학자다. 이에 따르면, 투표로 정권 교체만 이뤄지면 민주주의 체제다.
책은 제목 그대로 민주주의의 한계와 가능성을 역사와 이론 양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한다. 예컨대 ‘인민의 자치’란 이상은 논리적으로 일관돼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선호를 가져야 한다’는 실현 불가능한 가정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애당초 ‘미션 임파서블’이다. 참여 민주주의도 모순적 개념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한데, 모두가 평등하면 어느 한 사람도 결과에 인과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책을 한 권만 읽는다면 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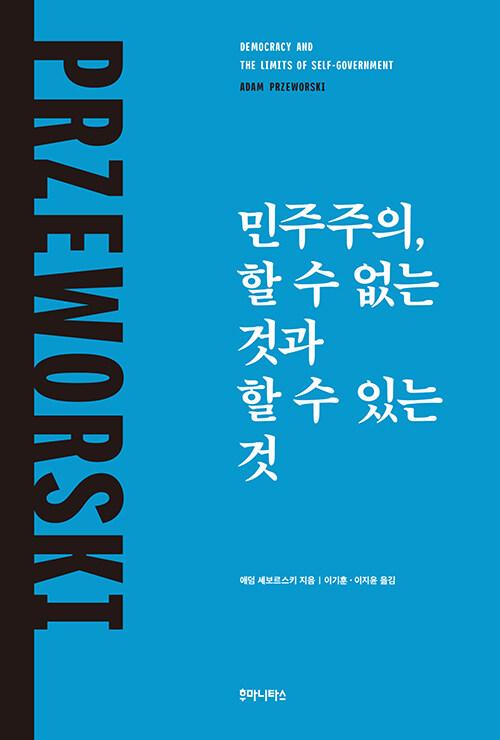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낮춘 최소주의적 관점은 인민을 고작 투표 기계로 보는 냉소주의일까. 그건 아니다. 경제적 평등, 효과적 참여, 완벽한 대리인, 자유라는 네 가지 이상에서 모두 한계가 있지만 다른 어떤 체제도 나을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여전히 가능성을 품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합리한 기대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실현 가능한 개혁들은 보지 못하고 포퓰리스트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게 그의 우려다. 이런 한계와 가능성을 인식해야 “인민이 다소나마 평등하고 자유롭게,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참여하여, 서로 다른 희망·가치·이익에 따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화적으로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 등 여러 저작이 번역됐는데, 이번 책에선 그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다. 이언 샤피로 예일대 교수는 “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한 권밖에 읽을 시간이 없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