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김이구의 동시동심] 늙은 호박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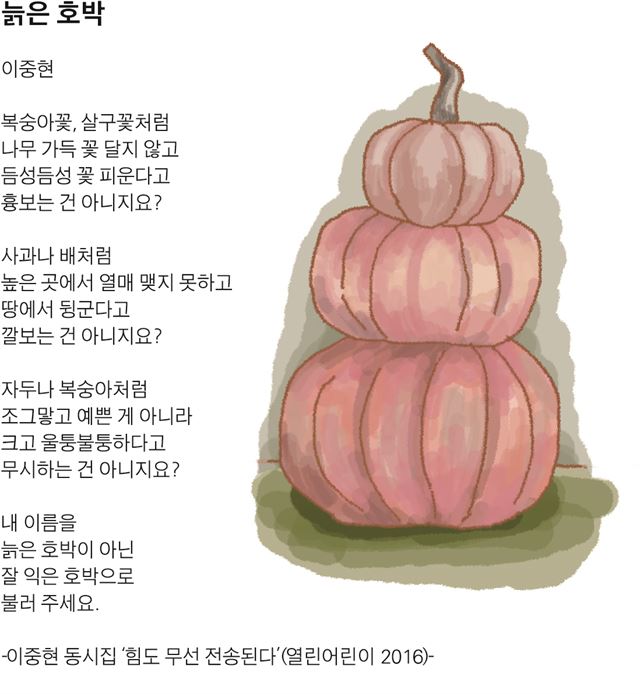
시골 집 마당가에서 무심하게 익어 가는 누런 호박은 늦가을 정취를 돋우는 것 중의 하나일 것이다. 애호박 때 손이 가지 않고 남겨진 몇몇 호박들은 크고 단단해져, 아직도 푸른 기운이 다 삭지 않은 쟁반만 한 호박잎들 사이에서 그 여유만만한 몸통이 절반쯤 드러난다. 덩굴에 듬성듬성 핀 꽃 중 암꽃 아래 파란 구슬처럼 달린 호박은 수분이 되면 떨어지지 않고 점점 자란다. 밤톨만 하던 아기 호박은 전을 부치거나 된장찌개에 넣기 좋은 애호박 시기를 거쳐 조금씩 조금씩 몸집을 불려 늦가을에 다다라서는 한아름 듬직한 덩치로 실하게 여문다.
‘늙은 호박’이라는 지칭에 대해 갸웃해 본 적이 있었던가. 호박은 항변한다. “내 이름을/ 늙은 호박이 아닌/ 잘 익은 호박으로” 불러 달라고. 사과나 배, 복숭아 등 과일들은 먹기 좋고 때깔이 나게 숙성하면 잘 익었다고 한다. 참외나 수박, 고추 등도 잘 익었다고 하지 늙었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호박은 애호박, 늙은 호박으로 불리니 재미있다. 오이도 풋풋할 때를 지나 따지 않고 두면 누렇게 되어 ‘노각’이라 불린다.
호박은 다른 여러 과일들과 자신을 비교하여 “듬성듬성 꽃 피운다고/ 흉보는 건 아닌”가, “땅에서 뒹군다고/ 깔보는 건 아닌”가, “크고 울퉁불퉁하다고/ 무시하는 건 아닌”가 반문한다. 그러고서 자기 이름을 ‘늙은 호박’이 아닌 ‘잘 익은 호박’으로 불러 달라고 청한다. ‘늙은 호박’이라는 통상의 지칭에 의문을 품고 호박을 화자로 삼은 이중현 시인의 ‘늙은 호박’은 우리의 통념에 이의를 제기한다. ‘늙은 호박’이 아니라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호박이라는 것이다. 복숭아나 사과, 자두 등은 때를 지나면 떨어지거나 볼품없이 썩어 가는데, 호박은 그렇지 않다. 땅에서 뒹굴며 오래될수록 단단하게 여물어, 넝쿨이 다 시드는 겨울이 와도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킨다. 의연하다. 사람도 나이 든 이를 ‘늙은 사람(노인)’으로 칭할 것이 아니라 ‘잘 익은 사람’으로 칭하면 어떨까. 그러려면 연륜에 따른 경륜과 인품을 실하게 갖춰야 할 것 같다.
‘잘 익은’ 호박을 껍질을 벗기고 속을 발라내어 썰어 두면 여러 요리 재료가 된다. 얇고 길게 도려 처마 밑 등에 걸어 말려서 호박고지를 만들어 보존하기도 했다. 검색을 해 보니 약효가 좋아 부기를 빼고 이뇨 작용을 돕는다고 한다. 그 외에도 갖가지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 계절의 풍상을 응축해 ‘잘 익은’ 덕분이 아닌가 싶다.
김이구 문학평론가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